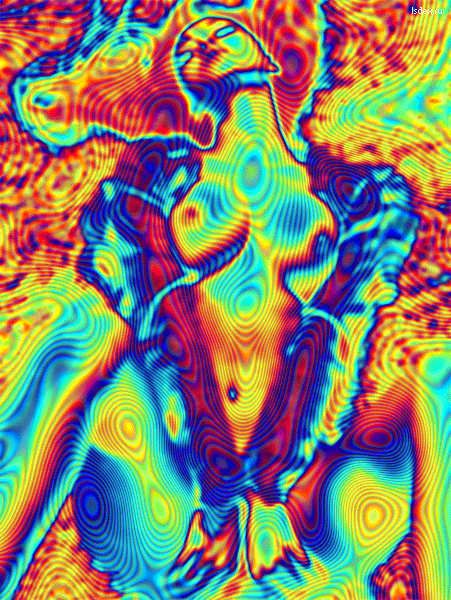
나도 마른다
신달자
붉은 고추 널어놓은
옆집 한옥 마당에
나도 누워 뒹굴면
온몸 배어나는 설움 마를까
그러려무나
물기 완전 날아가고
빈 젖 같은
마른 씨 안고 있는 화형 직전의 고추같이
바다를 제 몸 안으로 거둬들였음에도
바짝 마른 멸치같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
붉은 고추가 한옥 마당에서 마르고 있다. 아마도 '앞니만 한 뜰'에서였을 것이다.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고 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처럼 가을이 마르고 있다.
가을 햇살에 하나의 풍경도 마르고 있다.
우리 모두도 마른다. 수척해진다. 구르는 낙엽처럼 종일 뒤척인다. 형체가 왜소해진다. 비워진다.
그리하여 무념(無念)에 이르러도 좋을 일이다.
신달자 시인은 시 '계동 가을'에서 '구절초// 한 잎 같은// 방에 누워// 그 꽃잎만 한 이불로// 11도의 서늘함을 가리고// 그 꽃잎 하나 같은// 내일을 생각하다'라고 썼다.
가을에는 실로 우리도 구절초 한 잎 같다. 한 잎처럼 작아져 한 가닥 바람에 홀로 흔들린다.
- 문태준<시인>
'(詩)읊어 보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143]가지가 담을 넘을 때 / 정끝별 (0) | 2023.11.26 |
|---|---|
| [3142]나는 배웠다 / 양광모 (0) | 2023.11.17 |
| [3140]아픈 사람 / 김언 (0) | 2023.09.28 |
| [3139]은현리 홀아비바람꽃 / 정일근 (0) | 2023.09.18 |
| [3138]아버지의 소 / 이상윤 (0) | 2023.09.05 |
